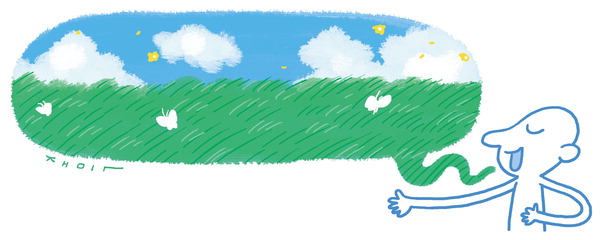가끔 시 낭송대회의 심사를 맡게 된다. 한 기업이 주최하는 지역별 예선 심사에 참여해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이 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여성 참가자뿐만 아니라, 젊은 남성이나 어린 학생의 대회 참가가 부쩍 늘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어린 학생들은 사람들 앞에 선 적이 별로 없어 잔뜩 긴장한 탓에 암송한 시구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그럴 때마다 청중이 손뼉을 쳐서 격려를 보내는 훈훈한 장면도 만날 수 있다. 시를 짓고, 시를 낭송하고, 시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열의가 우리나라처럼 뜨거운 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던 때에는 교실에서도 시조나 시를 암송하게 했는데, 그 시조와 시들은 아직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 있다. 물론 동요도 마찬가지이지만….
한 사람의 내면에 시가 들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다. 그것은 푸른 보리밭 위로 종달새가 날아오르는 것에 비유할 만하다. 우리의 내면에는 많은 것이 들어 있다. 신념과 같은 견고한 것도 있고, 여러 빛깔의 감정도 있고, 옛 시간의 흔적인 사진도 있고, 노래의 악보도 있고, 채집한 언어도 있다. 이들은 내면에서 활동하면서 지금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읽고 암송한 시는 채집한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곤충의 더듬이처럼 예민하고, 홀씨처럼 가볍고, 또 밝은 빛 그 자체인 이 언어들이 우리의 가슴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근사한 일이다.
예를 들면 유치환 시인의 시 ‘행복’의 ‘사랑하는 것은/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오늘도 나는/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뵈는/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시구가 살아 숨 쉬는 마음은 얼마나 매력적이겠는가.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이제 다 못 헤는 것은/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별 하나에 추억과/별 하나에 사랑과/별 하나에 쓸쓸함과/별 하나에 동경과/별 하나에 시와/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라고 쓴, 윤동주 시인의 시 ‘별 헤는 밤’이 한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다면 이 사람은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시를 떠올려 생기와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원로 언론인이면서 시 낭송 문화를 확산시켜 온 공로로 우리나라 최초의 명예 시인으로 추대되었던 김성우 선생의 책을 최근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시 낭송 운동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해방 이후 시 낭송 운동은 시인들의 자작시 낭독의 무대였다. 1948년에 ‘시낭독 연구회’가 간판을 내걸어 낭독회를 열었는데, 오장환 시인의 ‘병든 서울’ ‘헌사’ 등이 여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2월 부산에서 대규모 시 낭독회가 열렸다는 사실은 의외였다. 현역 시인 33인이 참여했다. 김성우 선생은 청중으로 이 시 낭독회를 보았다고 했으며, 박인환 시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시를 낭독했고, 김수영 시인은 무대 위를 좌우로 배회하면서 낭독했고, 김규동 시인은 종이에 써 온 자신의 시를 무대에서 다 읽고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시를 쓴 종이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술회했다. ‘시인 만세’라는 대규모 시 낭독회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 1967년 서울에서 열린 시 낭독회에는 3000명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그로부터 19년 후인 1986년 두 번째 ‘시인 만세’에도 1200명의 시민이 낭독회를 찾았다. 세 번째 ‘시인 만세’가 열린 1987년 11월 1일에는 4000명의 관객이 행사장에 들어찼고, 이날은 ‘시의날’로 제정되었다.
해마다 열리는 전국의 주요 시 낭송 경연대회의 수는 2016년 현재 80개 정도나 된다고 한다. 정기적으로 시 낭독회를 열고 있는 애호가 모임도 엄청나게 늘었다. 대표적인 시 낭송회로 ‘공간 시 낭독회’를 꼽을 수 있다. 이 모임은 1979년 시인 구상, 성찬경, 박희진 시인이 주축이 되어 생겼다.
시를 낭송하는 단체 가운데 요즘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단체라면 ‘재능시낭송협회’가 아닐까 한다. 이 단체는 시 낭송을 애호하는 사람이 모여 1993년 결성했고, 등록된 회원은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 사업을 하는 재능교육이 아낌없는 후원을 하고 있다. 낭독의 문화는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산문이나 소설 낭독회도 열리고 있다. 작가들이 신간을 출간하면서 갖는,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형식이 낭독회로 대체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 방송사에서 아이돌의 낭독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해 화제가 되었다. 낭독과 기부가 결합한 이 프로젝트는 아이돌이 자신의 음성을 재능 기부해서 문학작품 낭독자로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제작한 낭독 음원의 수익 일부를 활용해서 문화 혜택에서 소외된 청소년을 돕는 것이다.
일선 고교에서 열린 시 낭독회에 참여한 적도 있었는데, 한 편의 시를 해석해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직접 만든 UCC는 매우 흥미로웠다. 학생들의 입체낭독도 기대 이상이었다. 심지어 학생들은 시 작품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 낭독하기도 했다.
한 편의 문학작품은 작품 그 이상이다. 한 권의 책은 책 그 이상이다. 작품이 낭독되는 순간 작품의 문장들은 읽은 이의 내면으로 들어간다. 내면으로 들어가 내면이라는 방의 스위치를 켠다. 무엇인가를 촉발한다. 그리고 그 내면을 썩 괜찮게 가꾼다. 사막이 되어가는 거칠고 독단적인 마음을 너그럽고 비옥한 상태로 바꿔놓는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그에게로 가서 나도/그의 꽃이 되고 싶다//우리들은 모두/무엇이 되고 싶다/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는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이다. 시 낭송가들이 애송하는 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가 한 사람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있다면 그의 가슴은 얼마나 향기로울 것인가. 낭독의 문화가 여름날의 식물들처럼 자라났으면 한다.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