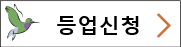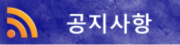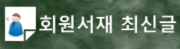짧은 글 쓰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한 문장의 길이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문장의 길이가 짧아지면 단숨에 잘 읽히는 장점이 생깁니다. 한번에 잘 읽히면 그 글이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글을 참 잘 썼다고도 생각되겠죠. 쓰기도 편하고 읽기도 편한 글. 짧고 쉬운 글이 좋은 글인 이유입니다.
다음 두 글을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①“오랜만에 인스타그램을 들어갔다가 팔로 요청이 와 있는 걸 발견하고는 내 눈을 의심했다. 내 기억 속에서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지 않았다.”
②“‘팔로 요청’. 두 눈을 의심했다. 그 사람이었다. 기억 속에서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사람. ‘확인’을 누르지 않았다.”
확실히 단문으로 쭉쭉 이어지는 2번 글이 속도감 있게 잘 읽힙니다.
“예술은 그 자리에서 단번에 이해돼야 한다. 형용사와 부사를 최대한 많이 지워라. 독자의 이해를 방해하고 독자를 지치게 한다.”
근대 단편소설의 거장으로 꼽히는 안톤 체호프의 명언입니다. 오히려 짧은 글에는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짧지만 모든 걸 담아서 한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직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글 쓰기의 어려운 점이기도 하죠.
저는 방송작가이기 때문에 한번에 쉽게 읽히는 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을 진행자나 출연자가 한번에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써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방송은 인쇄 매체와 달라서 한번 흘러가 버리면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한 문장 안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려운 단어가 들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인쇄 매체를 읽는 독자라면 잠시 멈춰서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본 뒤에 다시 읽는 게 가능하죠. 방송은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문장뿐 아니라 내용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고려한 글쓰기는 방송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인쇄 매체에서도 독자에게 검색의 부담을 주지 않고 막힘없이 술술 읽히게 하는 게 좋은 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표현이라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낱말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한자어, 전문용어나 학술용어, 외국어, 약어 등은 쉽게 풀어서 써주면 좋겠죠. 제 강의를 듣는 수강생 중에는 변호사·공무원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뭘 모르는지 몰라서 어렵게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자주 하는 실수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것을 당연히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해서 생략하거나 건너뛰는 경우도 생기고요. 방송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이 대상이기 때문에 수준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로 맞춥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대상으로 한 글인지 고려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어나 표현이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검색 없이도 읽을 수 있는 글이 나옵니다. 단어 하나도 여러번 사전과 인터넷을 뒤져 가며 고민한 끝에 선택했다면 읽는 사람에게 좋은 글, 친절한 글이 됩니다.
쉽게 잘 읽히는 글을 위해서는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지시대명사도 자제하고요. 너무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한 표현 역시 명확하지 않아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확성과 진실성을 갖춘 글, 신뢰할 만한 표현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을 얻습니다.
매끄럽게 잘 읽히는 글은 ‘간결체, 건조체, 우유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결체라는 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한 문장의 길이가 짧은 글이죠. 건조체는 화려한 수식어들을 최대한 줄이는 문체입니다. 미사여구를 마구 나열하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너무 주관적이거나 감상적인 어휘를 자제하는 게 그 비결이에요. 우유체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부드러운 말을 뜻합니다. 군인 말투라고 하는 ‘다, 나, 까’ 어투가 딱딱한 강건체의 가장 쉬운 예고요. “~하는 것이다, ~한 것이다, ~라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문장을 마무리하는 것도 우유체가 아닌 강건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마치는 종결어미를 다양하게 번갈아 가면서 써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매번 똑같은 종결어미로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게 읽기에도 편하고 자연스럽게 잘 읽힙니다. 종결어미를 다양한 형태로 변주한 뒤 그 글맛을 느껴보세요.
한 문장의 길이가 어느 정도면 한번에 잘 읽히는지도 생각해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마침표가 찍힌 데까지를 한 호흡에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당한 문장의 길이가 몇 자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내가 쓴 글을 소리 내 읽어보면서 호흡이 가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곳에서 문장을 잘라줘야 합니다.
“언뜻 보면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도, 사물의 이치를 밝혀내는 데에도, 쉽고 간단하게 단순화하는 게 모든 것의 근본이자 원칙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 연재를 시작하며 쓴 첫 문장입니다. 장문이며 만연체입니다. 중압감과 긴장을 내려놓아야 좋은 글이 나온다고 했지만, 저도 사실 연재를 시작하면서 어깨에 단단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첫 문장을 잘 써야 한다는, 잘 쓰고 싶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한번에 많은 것을 담아야 한다는 생각에 문장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잘라서 쓰는 게 최선이지만, 문장을 그대로 두고 짧은 글의 효과를 내는 기술도 있긴 합니다. 사람들은 한 줄에 적힌 내용을 한 호흡에 읽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활용해 한 문장을 쪼개, 한 호흡에 읽을 수 있는 길이로 엔터키를 쳐서 줄 바꾸기를 해주는 겁니다. 기왕이면 한 줄에 들어가는 내용을 의미가 통하는 단위로 끊어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요.
“언뜻 보면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도,
사물의 이치를 밝혀내는 데에도,
쉽고 간단하게 단순화하는 게
모든 것의 근본이자 원칙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신문이나 공문 등 공식적인 글쓰기에서 이런 줄 바꿈은 허용되지 않지만, 에스엔에스 등의 디지털 글쓰기에선 가능합니다. 발표문이나 연설문을 작성할 때에도 만연체 문장을 간결체로 바꾸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송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