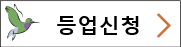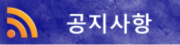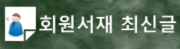(상략)
외롭고 슬픗할 때면 감나무 아래 기대 앉아서 저문 햇빛 수천 그루 노을이 되어 아득하게 떠가는 것 보았습니다. 흐르는 노을 그냥 보내기 정말 싫어서 두 손을 꼭 잡고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깜박 밤이 되면은 감나무는 하늘 위로 달을 띄워서 하늬바람 가는 길 내어 주지요.
사람들이 사는 곳 어두운 빛은 그만큼 밝았습니다. 세상은 달빛 속에 잠들어 가고 달빛 또한 세상 속에 잠들어 갈 때, 나는 감나무 가지 끝 까치밥 몇 개 글썽이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따지 않고 남겨 두어서 하늘까지 올라간 까치밥 몇 개, 외롭고 슬픗한 지난 한 해를 사무치도록 아름답게 간직했어요.
―서종택(1948∼ )
꽉 차 있는 시다. 여기 들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꼽아 본다. 아름다운 문장이 있고, 감나무와 햇빛과 노을이 있다. 하늘의 눈인 달이 떠 있고, 화자도 글썽이는 눈을 뜨고 있다. 하늬바람과 까치밥도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있는 게 많은데 없는 게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소리다. 여기에는 말소리, 그러니까 대화가 없다. 시에서 청각 이미지라고 부르는 것도 없다. 소리가 없는 세상이지만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는다.
의미를 담는 언어는 아주 다양한데 우리는 종종 언어가 곧 소리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런데 몸짓 언어도 언어고, 눈빛 언어도 언어고, 마음 언어도 언어다. 소리 있는 언어는 입에서 귀로 흐르지만, 소리 없는 언어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른다. 때로는 말이 되지 않은 언어가 더 진정성 있는 법이다.
이 시에는 소리는 없는데 비음성적 언어, 그러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르는 언어가 가득하다. 어린 화자는 감나무의 말을 듣고, 노을과 대화하며, 달빛과 감응한다. 이제 시가 꽉 찼다고 느껴지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아주 많은 대화가 들어 있다. 노을과 감나무와 하늘과 까치밥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 오래 잊고 살아왔다.
나민애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