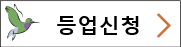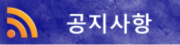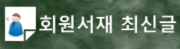한 그루 나무의 수백 가지에 매달린 수만의 나뭇잎들이 모두 나무를 떠나간다.
수만의 나뭇잎들이 떠나가는 그 길을 나도 한 줄기 바람으로 따라 나선다.
때에 절은 살의 무게 허욕에 부풀은 마음의 무게로 뒤처져서 허둥거린다.
앞장서던 나뭇잎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어쩌다 웅덩이에 처박힌 나뭇잎 하나 달을 싣고 있다.
에라 어차피 놓친 길 잡초더미도 기웃거리고 슬그머니 웅덩이도 흔들어 놀 밖에
죽음 또한 별것인가 서로 가는 길을 모를 밖에
―박제천(1945∼)
매년 입추가 지나년 입추가 지나면 바람의 온도가 달라진다. 처서까지 지나면 바람의 냄새도 달라진다. 사람도 동물이라서 이런 변화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끈적임은 선선함으로 변했고, 이제 곧 새 계절이 올 것이다.
시를 읽기에 가을만큼 좋은 계절은 없다. 읽기 좋을 뿐만 아니라 창작하기에도 좋은 계절이다. 결실과 낙화, 깊어짐과 헤어짐의 계절, 가장 사색적이며 철학적인 계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을의 시는 곧 만개할 국화꽃만큼이나 많아서 고르기 곤란할 정도다.
곧 찾아올 가을 어서 오시라고 두 팔 벌려 이 시를 읽는다. 더위에 정신이 어질해져 우리가 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었던 여름은 가라. 휘청이는 몸과 정신을 가누지 못해 옆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던 여름도 가라. 우리는 맑아질 필요가 있고 정돈될 필요가 있다. 고요히 깊어지고 가만히 높아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시인 역시 자연으로 눈을 돌렸다. 우리도 시인 따라 가을 만나러 간다.
수만의 나뭇잎이 곧 떨어질 것이다. 아무리 욕심내도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로운 생명체는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는 각자 헤어져 언젠가는 모두 죽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 가을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우리는 누구이며 지금 뭘 해야 하는가.
나민애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