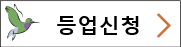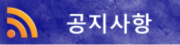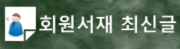풀밭에서
무심코
풀을 깔고 앉았다.
바지에
배인
초록 풀물
초록 풀물은
풀들의
피다.
빨아도 지지 않는
풀들의
아픔
오늘은
온종일
가슴이 아프다.
―공재동(1949∼ )
얼마 전만 해도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셨는지” 서로의 안부를 물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 코로나 대신 폭우에 “무탈하셨는지”를 묻는다. 서울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괜찮은지 전화가 오고 충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괜찮은가 전화를 건다. 그만큼 곳곳이 난리다.
한창 폭우가 내리던 때 나는 건물에 고립된 딸을 찾으러 길을 나섰는데 물은 점점 깊어져 허리까지 차올랐다. 두 팔을 들고 걸어야 할 정도였다. 사방은 위험하고 악취가 진동했다. 입었던 옷을 모아 빨래할 때에도 오수 냄새는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신발이랑 옷은 세탁이라도 하는데, 가게와 집이 잠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사라진 생명은 어떻게 하고 남겨진 슬픔은 또 어쩌나. 쉽게 사라지지 않는 아픔 때문에 오늘의 시는 ‘초록 풀물’이다. 이 와중에 시가 읽히느냐 묻는다면 이건 시이기 전에 이미 우리의 심정이라고 대답하겠다.
제목이 ‘초록’이고 ‘풀물’이니 상큼하겠구나 싶지만 이 시는 퍽 아프다. 시인은 바지에 묻은 풀물이 사실은 피이고 또 아픔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건 빨아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풀물이 지워진다고 해서 아픔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다. 올여름에는 비가 올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아프겠다.
나민애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