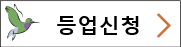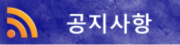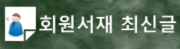노을이 질 무렵이면 혼자서 지붕 위로 올라갔다/그때 나는 새였다 새를 쫓는 고양이였다/지붕을 징검돌 짚듯 뛰어 항구를/돌아다니던 날도 있었다
나도 여울을 건너는 아비의 등에 업혀 있던 바위였다/세상을 버리고 싶을 때마다 당신은 나를/업어보곤 하였단다
바위를 품에 안고 지붕을 오르는 사람이 있다/해풍에 보채는 슬레이트 지붕을 묵직히/눌러놓으려는 것이다
수평선 너머 물고기들도 들썩이는 지붕 날아가지 않게/바다 위에 꾹 눌러놓은 섬들, 언젠가 나는/그 섬들을 짚고 바다를 훌쩍 건너가고 싶었는데
지붕에 우두커니 앉아 있던 내가 아직 내려오질 않는다/돌아오지 않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손택수(1970∼ )
인생은 돌발 상황을 두려워하지만 시는 의외성을 사랑한다. 예상과 다르다고 해서 다 좋다는 말은 아니다. 어떤 시에서는 우리의 짐작이 산산이 깨어지지만, 이상하게도 그 깨어짐이 멀리 달아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처음 이 시를 읽을 때는 그 유명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 아니라 하나도 안 유명한 ‘지붕 위의 바위’라는 의외성에 시선이 간다. 그리고 바위를 안고 지붕을 오르는 사람이 참 미련한 이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선은 깊어진다. 바위가 사실은 자식이었고, 아버지가 세상을 버리고 싶을 때마다 자식을 업어보며 위안을 삼았다는 부분에서는 좀 울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 바위 같은 자식이 아직도 지붕 위에 앉아 있다는 대목에서는 같이 앉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시에는 하나도 뻔한 이야기가 없다. 바위는 짐이었다가,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가, 섬이나 꿈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다. 그러니 시험 망쳤다고 우는 이여, 인생의 모든 전개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니다. 당신 마음의 괴로운 바위는 언제고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있다. 게다가 당신은 부모를 살게 만든, 소중하고 예쁜 바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민애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