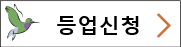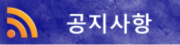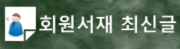선한 이여
나에게 바닥을 딛고 일어서라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네가 활보하다가 잠들던 땅을, 나를 기다리던 땅을
두 팔에 힘을 잔뜩 주고서
구부러진 무릎을 펼쳐서
어떻게 너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여기는 이미 깊은 수렁인데
선한 이여
손 내밀어 나를 부축하지 마세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너의 웃음과 울음을 두고서
나를 부르던 목소리와
너의 온기를 두고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모두 묻어두고서
떠날 수 있을까
여기는 이미 나에게도 무덤인데
―유병록(1982∼)
16세기의 허난설헌은 두 아이를 잃고 나서 ‘곡자(哭子)’라는 시를 썼다. 어린 자식을 잃은 심정이 어찌나 서럽던지 시인은 피눈물로 울음소리 삼킨다고 표현했다. 그 후로부터 몇백 년이 지났다. 지금은 허난설헌의 시대와 같지 않고 이 땅에는 변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그렇지만 모든 게 변했다는 것은 착각이다. 자식 잃은 부모, 형제 잃은 가족, 친구 잃은 사람들에게는 허난설헌의 피 토하는 심정이 멀지 않다.
이 또한 모두 지나가리라고 말할 수 없다. 훌훌 털고 어서 일어나라고 독려할 수가 없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가 없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시는 많고 많지만 지금은 그런 시들을 추천할 수 없다. 사회가 키워내야 할 어린 영혼이 너무 많이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아는 가장 아픈 시를 함께 읽는다. 해설할 수도 없이 가장 아픈 마음을 함께 읽는다. 허난설헌의 자식 잃은 슬픔은 사백 년이 지나도 잦아들지 않았다. 시인의 슬픔은 시 밖으로 철철 넘쳐흐른다. 오늘의 슬픔이 그 슬픔과 다를 리 없고 다를 수 없다.
나민애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