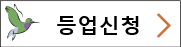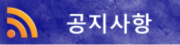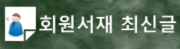진흙 반죽처럼 부드러워지고 싶다
무엇이든 되고 싶다
흰 항아리가 되어 작은 꽃들과 함께 네 책상 위에 놓이고 싶다
네 어린 시절의 큰 글씨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알맞게 줄어드는 글씨를 보고 싶다
토끼의 두 귀처럼 때때로 부드럽게 접힐 줄 아는 네 마음을 보고 싶다
베여 나간 나무 밑동의 향기에 인사하듯 길게 구부러지는
너의 훌쩍 자란 등뼈를 만져보고 싶다
(하략)
―진은영(1970∼ )
2022년을 진은영의 새 시집이 나온 해라고 기억하고 싶었다. 시집 제목은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이고 이건 무려 10년 만의 신간이다. 거기 실린 서른아홉째 작품을 여기 소개한다. 마흔두 개의 작품 중에서 단 한 편만, 그것도 일부만 수록해서 시인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 미안하다.
이 시를 처음 만난 건 2014년 가을, 한 문예지에서였다. 그로부터 무려 8년이 지났다. 다시 만난 시는 여전히 반가웠고 단어는 조금 달라졌다. “작은 항아리가 되어 벤자민 화분과 함께 네 책상 위에 놓이고 싶다”는 구절은 “흰 항아리가 되어 작은 꽃들과 함께 네 책상 위에 놓이고 싶다”로 바뀌었다. 이렇게 시간은 흘렀고 단어도 달라졌으니까 다른 것들도 조금은 바뀌었어야 옳다. 그래서 이 시가 8년 전보다는 덜 아프게 읽히길 바랐다. 그런데 아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한 이별은 너무 아프다.
진흙처럼 아무것이라도 되고 싶은데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게 죽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라고 살아가고 늙어가는 것도 볼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을 시인은 아파한다. 이른 죽음이 너무 많다. 2022년은 ‘진은영의 새 시집이 나온 해’라고만 기억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나민애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