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창작마당
창작마당
서울. LA, 호접지몽(胡蝶之夢)
드디어 봄이 되어, 복숭아꽃이 피고 하양 나비가 춤을 춘다.
지난해 겨울은 참으로 혹독했다. 영영 봄이 안 올 것만 같았다. 내 조국 한국에선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내 삶의 터전인 LA는 산불로 전쟁터보다 더 참혹한 폐허가 되어 버렸다. 내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이 두 곳은 내 삶의 근간이기에 충격이 컸다.
호접지몽은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장자(莊子)의 저서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 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호접지몽은 ‘나비가 된 꿈’이라는 뜻으로,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인가, 나비가 꿈에 장자가 된 것인가? 즉, 사물과 내가 한 몸이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 또는 인생의 무상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장자는 물(物)의 시비(是非), 선악(善惡), 미추(美醜), 빈부(貧富), 화복(禍福) 등 구분 짓는 일이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고, 만물은 결국 하나의 세계로 귀결된다(物我一體)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제창하였다. 물아일체는 구분 짓지 않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닌가.
나는 두통이 오면 습관적으로 나비가 된 꿈을 꾼다. 그리곤 가볍게 여기저기 꽃밭을 너울너울 날아다닌다. 나름 평온을 찾는 나만의 방식이다. 내게 나비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한국, LA의 참담함에 겨우내 마음속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만 외쳤다. 지금은 이 두 곳 모두 피해복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힘겨울 뿐이다. 쉽지 않은 사정에 걱정과 근심으로 두통까지 잦아, 매일 같이 나비가 된 꿈으로 견딘다. 현재 호접몽은 내 심리 치료제다.
복숭아꽃을 볼 때마다 고국이 생각난다. 고향 동구밖엔 큰집 과수원이 있었고 봄이면 복숭아꽃이 만발해 마음을 뒤숭생숭하게 했다.
꽃 가꾸기에 일가견이 있는 아내가 묘목을 사다 심으라는 권유를 마다하고 직접 복숭아씨를 눈에 잘 띄는 현관 앞에 세 개 싶었다. 세 개 모두 움트고 나와 잘 자랐으나, 두 그루는 어느 해 태풍에 꺾여 고사했고 한그루만 남아 잘 크는데, 그게 내 키만 하게 자랐다.
올해도 어김없이 꽃이 피려고 팥알 만안 싹이 나무 끝에 맺혔던 게 엊그젠데, 어느새 꽃이 활짝 피었다. 신비롭다. 복숭아는 작년에 처음 먹어 봤는데 달고 맛있었다.
작은 씨, 그 씨앗은 끝내 터서 나무가 된 것이다. 땅속에서 주변 상황과 섬세하게 교감한 결과다. 즉, 비. 바람. 햇빛과 교섭이 안 되면 클 수 없기 때문이다.
씨앗은 우주를 호흡하는 존재다. 겉은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수 없이 딱딱하지만, 안은 천체 모두를 느낄 만큼 예민한 촉수를 가졌기 때문이다. 강함과 부드러움의 이질적인 요소를 가진 완전체다.
씨앗은 속에 안드로메다의 수많은 별빛, 새소리, 대나무 소리. 달그림자, 기차 소리, 애기 살냄새, 오이 향기, 하늘거리는 코스모스, 등등을 진공포장 지에 압축시키듯 축소 시켜, 넣었을 것이다. 그 큰 것들을 다 담아 아주 작게 만들어 돌처럼 단단한 외피로 감쌌을 것이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면 자기 몸을 썩혀 이것들을 아낌없이 내놓고 열매로 변한다.
봄날, 내가 본 예쁜 복숭아꽃은 아득히 먼 행성의 소녀 눈빛이며, 내가 먹은 복숭아는 나비의 춤사위일 것이다. 내가 복숭아를 먹은 것인지, 복숭아가 나를 먹은 것인지, 모를 일이다.
공자 사상의 핵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仁)은 풍부한 감수성으로 남의 아픔을 잘 느끼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라 한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인(仁)’한 인간, 어진 사람이라는 것이다.
나도 감성적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물건이다. 민감하고 까탈스러워 글쓰기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만, 인격적으론 형편없는 칠푼이다. 어려서부터 약골로 살아와서, 내 몸 아픈 것만 예민했지 남 아픈 거에는 무심하고 둔감한 못난이다. 아니, 그냥 미성숙한 이기적인 인사다.
나는 무엇을 위해 평생 문학을 해왔던가?
작가란 씨앗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훌륭한 작가가 되지 못한 것을, 이제야 알았다. 나는 씨앗의 품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감히 씨앗의 기품을 따라갈 수야 없겠지만, 세상을 진실로 느낄 수 있도록 마음과 귀와 눈을 활짝 열어 놓아야겠다. 내 아픔이 아니라 타자의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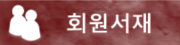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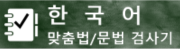
'세상을 진실로 느낄 수 있도록 마음과 귀와 눈을 활짝 열어 놓아야겠다.'
공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