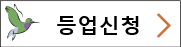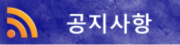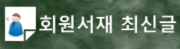나를 번역할 수 있다면 뜨거운 여름일 것이다/꽃가지 꺾어 창백한 입술에 수분하면 교실을 뒤덮는 꽃/꺼지라고 뺨 때리고 미안하다며 멀리 계절을 던질 때/외로운 날씨 위로 떨어져 지금껏 펑펑 우는 나무들/천천히 지구가 돌고 오늘은 이곳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단 한번 사랑한 적 있지만 다시는 없을 것이다/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과 너의 종교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몇 평의 바닷가와 마지막 축제를 되감을 때마다/나는 모든 것에게 거리를 느끼기 시작한다/누군가 학교에 불이 났다고 외칠 땐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운명이 정말 예뻐서 서로의 벚꽃을 떨어뜨린다/저물어가는 여름밤이자 안녕이었다, 울지 않을 것이다
―최백규(1992∼ )
우리는 지금 여름을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여름인 것은 아니다. 사람의 어린 시절은 풋풋한 봄이고 타오르는 청춘은 여름과 같다. 봄과 여름이 지나면 성숙의 가을과 노년의 겨울이 찾아온다. 사람의 한평생을 사계절에 빗대는 것은 아주 흔한 은유다.
사계절의 순환 구조는 일종의 진리여서 인생 말고도 다른 것들에 충분히 적용된다. 노스럽 프라이는 ‘비평의 해부’에서 문학 장르를 봄의 희극, 여름의 로맨스, 가을의 비극, 겨울의 아이러니로 나누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없다. 여름은 청춘의 계절이고, 청춘은 뜨거운 사랑을 시작하는 시기이며, 사랑은 곧 로맨스로 이어지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의 한복판에서 이 시를 읽지 않으면 무엇을 읽을까 싶다. 오늘의 시에는 여름과 청춘과 사랑과 뜨거움이 가득하다.
여기 ‘뜨거운 여름’인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사랑을 하고, 사랑 때문에 싸움을 하고, 싸움 끝에 이별을 하고, 이별 후에도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잊지 못한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자제되지도 않는 여름의 사랑은 한여름처럼 강렬하다. 그 맹목적인 사랑의 상태는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 네가 울어서 꽃이 진다니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표현인가. 그러면서 얼마나 마법적이고 시적이며 또한 아름다운 고백인가.
나민애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