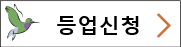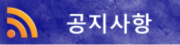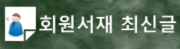바람 속에 묻혀 있기 때문이리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잎새에 가려 있기 때문이리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 미소가 보이지 않는 것은
수미산이 가려 있기 때문이리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로 솟구치는 몸부림
그대 가슴에 뚫린 빈 항아리에
담고 담는 반복이리.
―최원규(1933∼)
‘해가 좋아, 달이 좋아?’ 만약 시인에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이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질문에 필적할 만큼 난제다. 어려우니까 다수결에 따라보자. 정확한 수치를 헤아린 사람은 없지만, 우리나라 시에는 유독 달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니 나는 시인한테는 해보다 달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달은 해와 다르게 눈에 담을 수 있다. 눈에 담으면 마음에도 담게 된다. 시인들은 눈에 담고 마음에 담는 것들을 유독 사랑한다. 또, 달은 어둠을 조금 밝힐 수 있다. 해는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 주지만 어둠의 시간을 함께 견뎌주는 것은 달이다. 시인들은 완전한 행복보다 절망 속의 희망을 더 사랑하는 법이다.
그리고 달은 마음 그 자체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달은 연인이고, 이별한 사람에게는 슬픔이며, 상실한 사람에게는 그리움이다. 달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분명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다. 우리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달에 비추어 보고,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더욱더 달 속에서 찾는다. 저 달이 없었다면 시인은 더 가난했으리라.
달을 사랑하는 시인을 알기 위해 이 시를 읽는다. 보이지 않아도 거기 있는 걸 안다는 이야기, 머리로는 몰라도 마음으로는 안다는 이야기이다. 이 시의 뒤편에 수없이 많은 시인이 서 있다. 그들은 모두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마음이 있다고, 우리 마음들이 저 하늘의 달이 되었다고.
나민애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