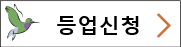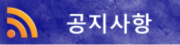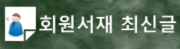꽃 같은 시절이야 누구나 가진 추억
그러나 내게는 상처도 보석이다
살면서 부대끼고 베인 아픈 흉터 몇 개
밑줄 쳐 새겨 둔 듯한 어제의 그 흔적들이
어쩌면 오늘을 사는 힘인지도 모른다
몇 군데 옹이를 박은 소나무의 푸름처럼
―박시교(1947∼ )
니체는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인간이 다 잊는 것도 아니고 다 잊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상처를 입게 된다. 그리고 상처가 깊으면 기억도 깊은 법이다. “삶의 강제가 안겨준 아픔의 흉터가 아니라면 기억이란 대체 무엇인가.” 유종호는 자전적 에세이 ‘그 겨울 그리고 가을, 나의 1951년’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모든 삶에는 아픔이 동반되기 마련이고, 우리의 기억은 아픔이 남긴 흔적이라는 말이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달력의 숫자는 바뀌었는데 나는 어제와 같은 인간이고, 일상은 비슷한 하루의 연속이다. 망년회의 시기는 끝났어도 고통을 잊는다는 뜻의 망년은 쉽게 완성되지 않는다. 지난해의 고민과 감정까지 해를 넘어 따라오기 때문이다.
새해가 시작된다고 해서 마법 같은 변화를 바랄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해인데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이 시를 소개한다. 연륜이 깊은 이 시인은 흉터가 오늘을 사는 힘이 된다고 말한다. 인생의 상처라는 것이 피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거라면 새해에는 상처가 단단한 흉터가 되기를 이 시를 읽으면서 바라본다.
김초엽의 단편소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는 이런 구절로 끝이 난다.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 이 구절을 빌려 새해의 희망 사항을 읊어본다. 우리는 괴로울 테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것이다.
나민애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