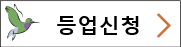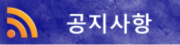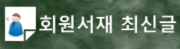|
문학 세미나를 위해 LA를 찾은 정순진 교수. |
“문학을 하는 이, 글을 쓰는 이는 곡비처럼 내 슬픔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대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곡비는 상갓집에 곡이 끊어지지 않도록 곡을 하는 계집종을 말한다.
대전대 국어국문창작과 정순진 교수가 수필문학가협회(회장 김화진) 주최 ‘봄 문학 세미나’ 강연을 위해 LA를 찾았다. 세미나는 오늘(5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열린다.
강연은 3강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1강은 ‘곡비. 관세음.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2강에서는 수필에 포커스한 강의, 3강에서는 정 교수가 25년간 만들어온 ‘가족 신문’에 대한 이야기다.
정순진 교수는 충남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충남대서 문학 석.박사를 받았다. 1991년 문학예술 신인상으로, 1992년 여성신문사 여성문학상으로 각각 문학평론가와 수필가로 등단했다. 1993년부터 23년간 가족 신문을 만들고 책으로 펴내면서 가족의 소통에 대한 강연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이번 강연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
가족신문 100호. |
“글 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글을 쓰는 이는 곡비이기도 하고 불교로 보면 관세음보살, 가톨릭에서 보면 마리아여야 한다. 모든 세상의 고통스러운 소리,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듣는 사람. 그걸 들어서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어야 한다.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내가 잘 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글 쓰는 사람이다. 물론 다 갖춘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좋은 글이 나온다고 본다. 그렇게 쓴 글이어야 읽는 이들이 삶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아 갈 수 있지 않겠나.”
-수필은 다른 장르와는 어떤 차이가 있겠나.
“수필은 자신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르다. 수필의 가장 큰 장점이 진심과 진실이다. 진심과 진실이 있다면 지옥에 다녀온 경험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 경험한 것이기 더 큰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 삶과 수필이 둘이 아니고, 약과 수필도 서로 다르지 않다.“
-가족 신문을 23년이나 만들었다. 시작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나.
“25년 전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시작했다. 둘째가 한글을 배우면서 남편과 아이들 둘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다섯 가족이 모두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이제 막 한글을 배운 작은 애가 처음 쓴 글의 제목이 ‘나는 똥이야’였다. 가족 중에서 자기만 잘하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웃음) 그렇게 시작된 가족 신문을 지난 2015년까지 23년간 계속했다.”
-가족을 모두 참여시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92세인 시어머니는 당시 67세였다. 초등학교만 나왔던 어머니는 사실 평생 글을 써 본 적이 없었고 부담스러워 했다.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글을 쓰냐’며 사양했다. 설득 끝에 마지못해 쓰시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머니 글을 좋아하는 독자 펜까지 가장 많았다. 또 가톨릭 문우회 개최한 글쓰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다섯 명이 시작한 신문이 해를 거듭하면서 친척들도 참여하게 됐다. 처음 4페이지로 시작한 신문은 가장 많이 나올 때는 32페이지까지 만들기도 했다.”
-가족 신문을 만들며 가장 좋았던 점은.
“서로를 좀 더 알아갈 수 있었던 부분이다. 36년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하지만 신문이 아니었다면 어머니의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 등 살아온 이야기나 마음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시집살이를 하던 때 밥을 훔쳐 먹다가 혼난 일 등을 어떻게 알았겠나.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둘째 아들은 호된 사춘기를 치렀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졸업만 했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이었다. 물론 아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였는지는 아들이 신문에 쓴 글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다. 아들은 당시 아파트 옥상에 몇 번이나 올라갔었다고 신문에 썼다.”
-가족신문은 가족들만 읽었나.
“아니다. 가족들 외에도 친한 지인들과 아이들의 담임선생님에게도 보냈다. 그 중에서는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우표를 100장을 보내주신 분도 있었다. 신문을 읽은 분들이 피드백을 보내주면서 독자란을 만들기도 했다.”
-신문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나.
“맞다. 많은 이들이 주변에서 시도를 했지만 오래 지속하지는 못하는 걸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등 더 다양한 방법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많다. 가족간에도 소통이 중요하고 글은 좋은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말과 글은 다르다. 말은 일상적이지만 글은 사고를 담는 그릇이다. 글은 써 놓으면 생명력이 길다. 오래도록 남는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힘들다면 부정기적으로라도 글을 통해 소통하는 것을 권해 보고 싶다.”
▶세미나 문의:(323)440-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