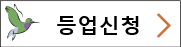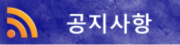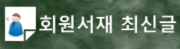오리만 더 걸으면 복사꽃 필 것 같은
좁다란 오솔길이 있고,
한 오리만 더 가면 술누룩 박꽃처럼 피던
향이 박힌 성황당나무 등걸이 보인다
그곳에서 다시 오리,
봄이 거기 서 있을 것이다
오리만 가면 반달처럼 다사로운
무덤이 하나 있고 햇살에 겨운 종다리도
두메 위에 앉았고
오리만 가면
오리만 더 가면
어머니, 찔레꽃처럼 하얗게 서 계실 것이다
― 우대식(1965∼ )
우리가 ‘아름다울 미(美)’라고 부르는 개념을 고대 그리스인들은 ‘칼론(kalon)’이라고 불렀다. 칼론은 육체의 눈과 정신의 눈으로 감지되는 덕목이다. 움베르토 에코는 이 오래된 아름다움이 그리스인들에게 즐거움, 즉 쾌감을 선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름다운 것은 분명히 좋다. 모두에게 아름다운 것은 모두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런데 모두가 아니라 나에게만 특별히 아름답다면 사정이 조금 다르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 생각을 떨칠 수 없고, 그 존재를 지울 수 없고, 잃어도 잃어버릴 수 없으면 즐겁지 않다.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은 애잔해서 차라리 슬픔에 가깝다. 우리는 때로 뭔가가 사무치게 아름다우면 목 놓아 운다. 이 시도 아름다워서 슬픈 시가 되었다. 오리만 가면 꿈에 나올 듯한 장소가 있다. 거기서 더 오리만 가면, 더 오리만 가면 봄이 있다. 봄의 풍경이 이렇게 잔잔하고 멀고 아름답다. 반달 같은 무덤이라는 표현에서 한번 멈칫하고 우리는 시인이랑 다시 오리를 간다. 마지막으로 만날 사람이 있다. 봄보다 더 반가운 어머니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복사꽃, 누룩 내음, 고향, 봄, 햇살과 어머니까지 세상 좋고 아름다운 것이 한데 모여 있으니 좋지 않을 리 없다. 좋은데 참 슬프다. 슬픈데 참 아름답다.
나민애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