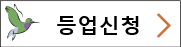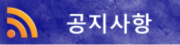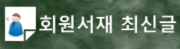언젠가 식탁 유리 위에 한 줌의 생쌀을 흩어놓고 쇠젓가락으로 하나하나 집으니 어느새 눈물이 거짓말처럼 멎는 거야 여전히 나는 계속 울고 있었는데, 마치 공기 중에 눈물이 기화된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며 또 너는 운다
나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쇠젓가락을 가지고 네 맞은편에 앉는다
그리고 쌀알처럼 떨어진 네 눈물을 아무 말 없이 하나하나 집는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의 형태라는 듯
(하략)
―김중일(1977∼ )
슬플 때면 대청소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속상할 때 설거지를 더 뽀득하게 하는 사람도 알고 있다. 말해서 무엇 하리. 일부의 심정은 말로 풀어지기에는 너무 단단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깊다. 입이 차마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건 몸으로 간다. 그래서 어떤 청소나 설거지는 마치 한이 서린 살풀이 춤사위 같기도 하다.
몸으로 표현하는 슬픔의 행위. 오늘의 시는 그 행위 목록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 그건 바로 젓가락질이다. 너무 슬픈 한 사람이 생쌀을 꺼내 왔다. 그걸 식탁 유리에 쏟는다면 집기 어려우리라. 익히지 않은 생쌀은 단단하고 고집스럽다. 젓가락으로 쌀알을 하나씩 집다 보니 어느새 울음을 그치게 되었다. 쌀알 집은 이야기는 어디 하나 슬픈 구석이 없지만, 저 장면을 가만히 상상하다 보면 어디 하나 슬프지 않은 부분이 없다.
여기서 흩어진 쌀알이란 눈물방울이다. 겨우 한 줌의 슬픔을 다 집어내는 데에도 퍽 많은 땀과 시간을 쏟아내야 할 것이다. 혼자서는 지쳐서 아마 다 집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인은 맞은편에 앉아 같이 젓가락을 들었다. 그냥, 같이 슬픔을 집어낸다. 없어진 눈물이 쌀알 한 톨만큼이라도 좋다. 그건 지금 너무나 필요한 일이 아닌가.
나민애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