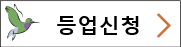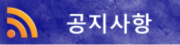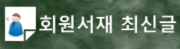돌이켜보아도 무례한 빛이었다. 최선을 다해 빛에 얻어맞고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길이었다. 응고되지 않는 말들, 왜 찬란한 자리마다 구석들이 생겨나는가. 너무 깊은 고백은 테두리가 불안한 웅덩이를 남기고. 넘치는 빛들이 누르고 가는 진한 발자국들을 따라. 황홀하게 굴절하는 눈길의 영토를 따라. 지나치게 아름다운 일들을 공들여 겪으니 홀로 돋은 흑점의 시간이 길구나. 환한 것에도 상처 입는다. 빛날수록 깊숙이 찔릴 수 있다. 작은 반짝임에도 멍들어 무수한 윤곽과 반점을 얻을 때, 무심코 들이닥친 휘황한 자리였다. 눈을 감아도 푸르게 떠오르는 잔영 속이었다. ― 이혜미(1988∼)
움베르토 에코의 책 ‘미의 역사’에 따르면 중세의 예술은 빛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대성당의 정교한 창유리를 통해 빛이 내부로 들어오면 그 아래에 있는 신도들은 신성함에 감격하곤 했다. 많은 문명에서 신은 빛과 동일시됐다. 이집트의 ‘라’, 페르시아의 ‘아후라 마즈다’ 역시 모두 태양빛을 상징하는 신들의 이름이다. 그 빛 안에 안기고 싶지 않은 인간은 없었으리라.
신성이 사라진 근대에서도 빛은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하다. 사람들은 채광이 잘 드는 남향 집을 좋아한다. 식물은 빛을 받아야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데 과연 식물만일까. 우리의 건강 상태에도, 우리의 마음 상태에도 빛이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찾기 어렵다.
다만 살면서 아주 강력한 빛에 휩싸이는 경험은 드물다. 이 시대의 조도는 늘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빛의 시를 준비했다. 시에서 빛이 사랑인지, 사람인지, 경험인지 확실치 않으나 시인은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빛에 강타당했다. 얼마나 강렬했는지 멍이 들 듯, 칼에 찔리듯 비틀거렸다고 나온다. 빛에 멍이 들 정도의 경험은 무료한 일상에 큰 파격이 될 것이다. 넘치는 빛 무리에 파묻히는 경험을 상상해본다. 일조량이 부족해 한 줌 빛에 목마른 우리에게는 부러운 일이다.
나민애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