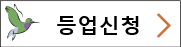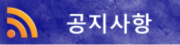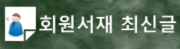금방 시드는 꽃 그림자만이라도 색깔 있었으면 좋겠다
어머니 허리 휜 그림자 우두둑 펼쳐졌으면 좋겠다
찬 육교에 엎드린 걸인의 그림자 따듯했으면 좋겠다
마음엔 평평한 세상이 와 그림자 없었으면 좋겠다
―함민복(1962∼)
그림자는 없는 듯 있다. 무채색인 주제에 늘 무겁게 처져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무심하게 밟고 지나가도 아야 소리 못하는 것. 그저 질질 끌려다니다 사람이 죽으면 함께 사라지는 것이 그림자의 운명이다.
쓸모없는 그림자라도 시인들만은 제법 좋아하고 중시했다. 가까이로는 김소월이 영혼을 일러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중국의 이백은 ‘월하독작’에서 말하길 달과 나와 그림자 셋이 모여 술을 마신다고 하였다. 고래로 많은 이들이 그림자를 또 다른 나, 혹은 영혼이라고 생각했던 듯하다.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그림자에 스며든 이야기는 많고도 많다.
있지만 없는 듯,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우리의 일부가 그림자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발치에도 있고, 우리 바깥에도 있다. 함민복 시인은 그중에서 몇 조각을 이어 붙여 시로 만들었다. 꽃이 쉽게 지는 게 아쉬우니 지는 그림자가 색이라도 입었으면 한다. 어머니 휜 허리 안쓰러우니 그림자라도 펴졌으면 한다. 걸인이 고단하고 추우니 그림자라도 따뜻했으면 한다.
꽃도 어머니도 걸인도 다 서글프지만 그림자는 그중에서도 더 소외된 부분이다. 이걸 발견한 시인의 눈이 귀하고, 거기에 담긴 따뜻한 시선이 귀하다. 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자 지는 자리가 더 추운 겨울이니까.
꽃도 어머니도 걸인도 다 서글프지만 그림자는 그중에서도 더 소외된 부분이다. 이걸 발견한 시인의 눈이 귀하고, 거기에 담긴 따뜻한 시선이 귀하다. 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자 지는 자리가 더 추운 겨울이니까.
나민애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