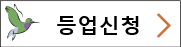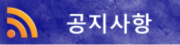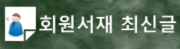반딧불을 쫓아가면,
빗자루를 둘러메고
동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멍석 핀 마당에 앉아
술래잡기를 했다.
별인 양 땅 위에선 반딧불들이
죄다 잠을 깬 밤.
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은 언제나 훨훨 날아
외양간 지붕을 넘어가곤 하였다.
반딧불이 사라진
외양간 지붕엔
하얀 박꽃이 피어 있었다.
―강소천(1915∼1963)
어린이날은 단 하루뿐이지만 사실 어린이의 모든 나날은 전부 어린이날이다. 그들은 날마다 행복하게 웃고 떠들고, 씩씩하게 뛰어놀고, 안전하게 오고 가야 한다. 어른이 지켜야 할 것에는 국방이라든가 법규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맑은 눈, 말랑한 손바닥, 보송한 머리카락을 지닌 어린이들을 날마다 보살펴야 한다. 조심히 지켜야 할 정도로 아이들은 연약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정도로 아이들은 소중하다.
세상의 더러움을 만든 건 어른이지 아이들이 아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만든 것도 어른이지 아이들이 아니다. 아이들이 만드는 것 중에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 아이들이 쌓는 것 중에 미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강소천의 시처럼, 마치 그림 같고 동화 같은 저 풍경처럼 맑고 깨끗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시 속의 아이들은 어디를 뛰어가도 안전하고, 어디를 둘러봐도 평안하다. 하늘과 별과 공기마저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안아주는 듯하다.
이 시를 쓴 강소천 시인은 어린이를 유독 사랑했다. 그는 ‘작은 샘’이라는 뜻의 ‘소천’을 필명으로 사용했는데 작은 샘이 바로 시인 자신이고, 모든 어린이이고, 동심이다. 시인은 아이들을 작아도 소중하고 귀한 샘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의 작은 샘들이 언제까지나 맑은 물소리를 내며 졸졸 흐르기를, 어린이의 5월에 바라본다.
나민애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