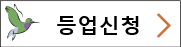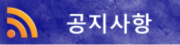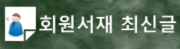물은 죽어서
물 속으로 가고
꽃도 죽어
꽃 속으로 간다
그렇다 죽어 하늘은
하늘 속으로 가고
나도 죽어서
내 속으로 가야만 한다.
―박중식(1955∼ )
우리의 봄은 항상 새봄이다. 조병화 시인의 ‘해마다 봄이 되면’에 보면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이런 구절이 나온다. 그 말처럼 봄은 새로움의 상징인 것이다. 새싹, 새 학기, 새 친구로 채워진 봄은 사람의 마음마저 싱그럽게 만든다.
그런데 봄은 과연 새롭기만 할까. 3월의 찬란함은 이상하게 기시감이 든다. 봄이 되면 ‘내가 아는 그 봄이 왔구나’ 하는 안도감도 든다. 봄은 새로운 것이면서 동시에 오래된 것이기도 하다. 낯모를 봄이 우리에게 찾아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봄이 드디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것이다.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일러 우리는 ‘회귀한다’고 말한다. 회귀는 단지 일직선상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형으로 순환을 그리면서 돌아간다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회귀는 다시 와서 반가운 것이고 돌아갈 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것이며 그래서 마땅한 일이다. 게다가 회귀는 절대로 드문 일이 아니다. 생명과 삶에서 회귀는 매우 자연스러운 본질이다.
회귀하는 계절의 아름다운 회귀를 맞이하여 회귀의 이치를 다룬 한 편의 시를 소개한다. 제목이 묘비명이지만 우울하거나 어둡지는 않다. 모든 것은 죽어 다 제게로,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내가 내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본다. 나한테 잘해주고, 너한테도 잘해주고, 돌아갈 때는 잘 돌아가고 싶다. 이 봄에는 더 잘 살고 싶다.
나민애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