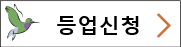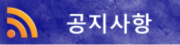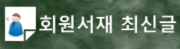지나간다
급행열차가 어지럽게 경적을 울리며
이따금
의지할 의자 하나 없고
빈 대합실에는
거기 조그마한 역이 있다
푸른 불 시그널이 꿈처럼 어리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아득한 선로 위에
없는 듯 있는 듯
거기 조그마한 역처럼 내가 있다.
―한성기(1923∼1984)
나는 누굴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수없이 던진다. 질문은 눈앞에 있는데 답은 숨어 있다. 나는 누굴까. 질문은 하나인데 대답은 자꾸 달라진다. 나는 누굴까. 질문은 처음부터 있었는데 대답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라이프니치라는 철학자는 나는, 너는, 모든 존재는 주름이라고 설명했다. 켜켜이 겹쳐진 주름처럼 존재는 그 안에 무한히 다른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의 말이 맞다면 ‘나는 누굴까’의 대답은 하나일 수가 없다. 그 대답은 거울 속에 있을 수 있고, 상상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다. 내가 품고 있고 품었던 모든 내가 모여 지금의 내가 되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나도 몰랐던, 내 속에 숨어 있던, 내가 몰래 바랐던, 사실은 이미 알고 있던 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한성기 시인이 시인 한성기도 아니고, 인간 한성기도 아니고, 아버지나 남편 한성기도 아니고 ‘조그마한 역’인 한성기를 꿈꿨던 것처럼 말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고즈넉한 풍경은 현실이 아니다. 그건 이 사람의 영혼 안에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작은 역도 현실이 아니다. 거기, 멀리, 아득하게 있는 역은 한성기 안에 있는 숨은 한성기다. 이런 작은 역을 자기 안에 품고 산 시인은 얼마나 충만했을까. 수없이 많다는 나의 한 조각을 찾기 위해서 사람은 시인이 되는가 보다.
나민애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