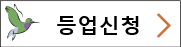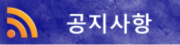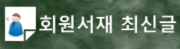어느 날 아침 게으른 세수를 하고 대야의 물을 버리기 위해 담장가로 갔더니 때마침 풀섶에 앉았던 청개구리 한 마리가 화들짝 놀라 담장 높이만큼이나 폴짝 뛰어오르더니 거기 담쟁이넝쿨에 살푼 앉는가 했더니 어느 사이 미끄러지듯 잎 뒤에 바짝 엎드려 숨을 할딱거리는 것을 보고 그놈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감탄을 연거푸 했지만 그놈 청개구리를 제(題)하여 시조 한 수를 지어볼려고 며칠을 끙끙거렸지만 끝내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놈 청개구리 한 마리의 삶을 이 세상 그 어떤 언어로도 몇 겁(劫)을 두고 찬미할지라도 다 찬미할 수 없음을 어렴풋이나마 느꼈습니다.
―조오현(1932∼2018)
사람은 하나인데 이름은 여럿일 수 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법명이 무산(霧山)이고 법호는 만악(萬嶽)이며 사람들에게는 오현 스님이라고 불렸다. 생전의 시인은 휘적휘적 나타났다 휙 사라지는,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은 분이었다. 이것만 좋다는 고집이라든가, 저것만이 귀하다는 아집이라든가, 갖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 집착은 스님과 가장 먼 것이었다. 세상 귀물이나 지나친 아름다움도 덤덤히 볼 분이었다.
그런데 달관의 달인마저 몹시 감탄한 것이 있다. 바로 생명이다. 시인은 청개구리로 시 쓰기 어렵다고 불평했지만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청개구리는 생명 그 자체고 생명은 참 다루기 어려운 소재다. 생명은 소중하여 찬란하다. 너무 찬란하여 시인은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기에 실패했다. 언어가 실패하고 생명이 이긴 것은 기쁜 일이다.
나민애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