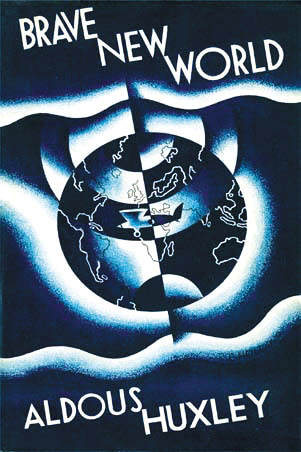
"바로 그것이 행복과 미덕의 비결입니다. (…)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숙명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죠."
1932년 영국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1894~1963)가 발표한 '멋진 신세계'는 잘못 사용된 과학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비극적으로 만드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디스토피아를 그린 20세기 최고의 예언적 소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이 책의 배경은 서기 2540년이에요. 지구는 '세계국'(World State)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국민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알파(지도층)·베타(중산층)·감마(하류층) 등 다섯 계급으로 나뉘었어요. 국가는 필요에 따라 원하는 계급의 인간을 맞춤형으로 대량 생산했죠. 인공 부화기에서 아이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 가정은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심리·정신적으로 추악한 곳으로 여겨졌어요. 사랑과 같은 '불필요한' 감정을 느끼는 대표적 집단이라는 이유에서죠.
계급 사이의 차별이 심했지만 국민은 불만이 없었어요. 반복적인 수면 학습과 전기충격으로 계급 맞춤형 세뇌를 받았기 때문이죠. 세계국이 정신 세계를 지배해 생각하는 능력을 마비시킨 거예요. 태어나기 전 정해진 '사회적 숙명'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정해진 노동과 자극적인 오락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기분이 나빠지면 복용 즉시 쾌락을 경험할 수 있는 '소마'라는 약을 먹었죠.
이곳에는 야만인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6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죠. 세계국과 달리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모체에서 태어나요. 존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호 구역에 방문한 세계국 사람들의 권유로 '멋진 신세계', 즉 문명 사회로 불리는 세계국으로 떠나게 돼요. 멋진 신세계 사람들은 젊은 존에게 호감을 보여요. 하지만 존은 이 세계가 점점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무엇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진정한 사랑도 없고, 가족의 가치도 없었어요. 획일적인 통제만 있었죠.
참다 못한 존은 이곳에 있는 통제관과 논쟁을 벌여요. 통제관은 그에게 "질병과 전쟁, 폭력과 다툼이 없는 이 세계가 가장 행복하다"며 목소리를 높여요. 하지만 존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아갈 권리, 고통으로 괴로워할 권리는 소중하다"고 말하죠. 야만인 보호 구역에서 살던 삶의 양식을 고수하던 존은 자유를 찾아 바닷가의 등대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합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말아요. 그렇게 작품은 끝이 납니다.
문명의 발전이 정말 인류의 행복을 보장할까요? 이 책은 90년 전 쓰였지만, 가상 세계(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인간의 삶을 바꾸고 있는 요즘에도 곱씹어볼 만한 고전이에요. 어쩌면 오늘의 이 시대를 미리 내다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