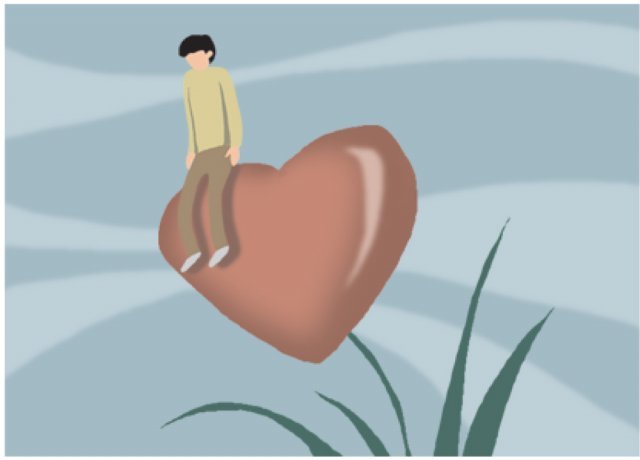
이건 무슨 꽃이야?/꽃 이름을 물으면/엄마는 내 손바닥에 구멍을 파고/꽃씨를 하나씩 묻어 주었네/봄맞이꽃, 달개비, 고마리, 각시붓꽃, 쑥부쟁이/그러나 계절이 몇 번씩 지나고 나도/손에선 꽃 한 송이 피지 않았네/지문을 다 갈아엎고 싶던 어느 날/누군가 내게 다시 꽃 이름을 물어오네/그제야 다 시든 꽃/한 번도 묻지 않았던 그 이름이 궁금했네/엄마는 무슨 꽃이야?/그녀는 젖은 눈동자 하나를 또/나의 손에 꼭 쥐어주었네―길상호(1973∼)
예전에는 가정이 출발점이라고 했다. 가정이 모여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가 모여서 세계가 된다고. 그러니까 가정은 씨앗 같은 거였다. 그걸 통해 우리는 멀리 나아가는 꿈을 꿨다. 멀리 갔다가 너무 힘들면 돌아오는 꿈도 꿨다.
지금은 가정이 출발점이 아니라 마지막 보루가 되었다. 심정적으로 여기 말고 안전한 울타리는 없는 것 같다. 가정마저 무너지면 더 내어줄 땅도 없다. 그래서 가족이 가족을 해쳤다는 뉴스를 보면 더없이 분노하게 된다. 엄마가 자식을, 자식이 노모를 때리고 죽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잠을 잊게 된다. 코로나를 피해 다들 동굴 같은 집으로 파고드는데 이곳마저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야 하나.
집은 동굴이 되고 마음마저 동굴처럼 어두워지는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등불이다. 때로 등불은 켜는 것이 아니라 심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등불을 심어주는 시를 소개하고 싶다.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때니까. 소중한 것이 사라지는 때니까. 반대로 단단하고 소중한 마음을 꽃씨처럼 심어 보자. 시에서 아들은 꽃 이름을 물었는데 엄마는 사랑한다고 대답했다. 사랑을 먹고 컸어도 ‘지문을 다 갈아엎고 싶던’ 힘든 날은 찾아왔다. 그럴 때 아들을 지탱해 준 것은, 꽃 같은 사랑만 준 어머니의 기억이었다.

늘 좋은 글, 시를 올려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