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창작마당
창작마당
<티 타임> 이성숙 편집장
인공지능의 출현은 유토피아의 서곡인가 디스토피아인가?
두 달 전에,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바둑대결을 놓고 미래에 대한 예측들이 쏟아져 나왔다. 알파고에 이어 오늘 아침 신문(16년 4월 25일자 미주중앙일보)에는 일본이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이 한국어를 공부 중이라는 기사가 또 떴다. 왓슨은 의료, 금융, 유통, 기상정보 등 다양한 인지 분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게 보통사람들의 삶이다. 인공지능이니 알파고니 하는 생소한 단어들을 나열해 놓고, 이것들이 가져올 미래가 장밋빛인지 먹빛인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편리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해 보이기도 한다.
일본 미즈호은행 도쿄중앙지점에는 왓슨이 고객상담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기사를 대하는 내 마음은 답답하다. 나는 새로 나오는 휴대폰 사양에도 적응이 더딘 터라, 은행에 볼 일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면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방문하여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은행에 전화를 해서는 사람(상담원)과 통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담원과 통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컴퓨터 음성이 지시하는 대로 여러차례 번호를 눌러야만 한다. 기계음에 부적응증이 있는 나로서는 곤혹스런 일이다. 지시를 따라가다 잠깐 실수라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경우도 예사로 생긴다. 그러기를 몇 차례 하고 나면 진땀이 난다. 그런데 이제는 은행을 찾아가도 사람 구경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으니 걱정이다. 입구에서 왓슨과 인사를 나누고 ‘그’와 이런저런 상담을 해야하게 생겼다.
은행 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고객상담센터에도 왓슨이 배치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귀찮은 고객을 상대하지 않아도 좋게 되었으니 환영할 법하다. 고객관리는 철저히 점수화할 게 뻔하고, 왓슨은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코드화한 답변을 해 줄 것이다. 상담원들은 더 이상 소위 감정노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른 양상이다. 현재도 은행이나 기업의 고객관리는 데이터화, 점수화 해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까지 점수화 하기는 불가능하다. 현재 어떤 사람의 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해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대면 상담을 하다보면 그 사람의 열정이나 회생가능성도 들여다 볼 수 있고, 그런 믿음 하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에게 대출이 가능해져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고객인 우리는 인간적인 읍소의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올해는 토마스 모어가 소설 ‘유토피아’를 써낸 지 5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소설 ‘유토피아’는 그리스어의 ‘없는(ou)’과 ‘장소(topos)’가 결합된 말이다. 즉, 이 세상에 없는 곳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토마스 모어가 구상하고 써 내려간 ‘유토피아’는 소피아(지혜)가 다스리는 이상국가다. 당시 영국의 부패한 군주와 귀족들을 풍자하면서 토마스 모어가 꿈 꾸고 있는 이상사회를 그리고 있다. 혹자는 그의 소설에서 제시된 정치 사회의 제도들이 현대 사회에서 실현된 것들이 많다는 것을 들어 유토피아의 의미를 ‘아직 오지 않은 세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토마스 모어가 제시하는 이상사회는 공평한 분배를 기저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평한 분배가 공평한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최근에는 ‘이상사회’라기 보다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이라는 견해에 무게가 더 실리는 느낌이다. 시각에 따라 온도차는 있으나, 오늘날 사회학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유토피아는 현재보다 나은 세계에 대한 기대임은 분명해 보인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인간의 출현은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서곡인가, 디스토피아를 향하는 것인가?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끝난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정돈되지 못한 굿판을 본 듯 심기가 불편하다. 이제야 드는 생각이지만, 이 시끄러운 논란(인공지능을 앞세운 미래 예측)은 주체의 기준을 잘못 정한 데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 싶다.
과거나 현재나, 문명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인간의 손에 달렸다. 이용자가 어떤 가치로 과학을 이용하는 지에 따라 우리는 과학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과학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 인간본위의 사고 아래 과학이 발전한다면 과학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우리가 관심가져야 할 것은 과학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학적 산물이 어떤 사람의 손에 놓이는가 하는 문제여야 한다.
실제로 알파고의 등장보다, 개발자인 구글이 앞으로 이 알파고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세계적인 관심이고 또, 나의 기대고 우려다. 다 알듯이, 다이나마이트의 발명은 개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늘날 가공할 전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인도가 낳은 성자 마하트마 간디의 묘비에는 후세대에게 전하는 일곱 가지 경구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첫 째, 원칙없는 정치 둘 째, 불로소득으로 얻은 재물 셋 째, 양심없는 쾌락 넷 째, 윤리가 결여 된 지식 다섯 째, 도덕성이 결여된 경제활동 여섯 째, 인간성이 결여 된 과학 일곱 째, 자기희생 없는 종교 등이다. ‘인간성이 결여 된 과학’이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인간본위의 사용자 의식이 과학의 진화보다 앞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4월 25일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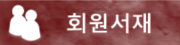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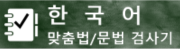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자고 만든 문명이
점점 주인이 되어간다는 느낌을 언뜻 언뜻 들 때다
있습니다.
2008년도에 본 영화 Wall-E가 떠오릅니다.
기계를 개발해
기계로 움직여 움직일 일이 없는 살찐 인간들이
기계에 의지해 살아가는 모습들이요.
일도 안하고 먹고 놀기만 하고 기계가 다 움직여 주는 우주선이
유토피아라고하죠.
컴퓨터나 핸드폰이 고장이 날 때,
혹은 정전이 되면
멘붕 상태가 되는 자신을 보며 놀란답니다.
편리에 의해 만들어진 기계를
잘 사용하는, 이용하는 인간이 되어야겠지요. 좋은 작품, 잘 읽었습니다.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