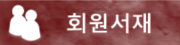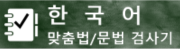- > 창작마당
창작마당
팬옵티콘 이성숙 편집장
유리알 세상이란 단어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익숙해졌다. 남편이 대기업 샐리리맨이었던 때가 있었다. 그 때 나는 ‘유리알 세상’을 피부로 겪었다. 간혹 특별 상여금 같은 명목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 내 손에 급여봉투가 들어오기도 전에 친척이나 친구들이 먼저 알고 축하인지 시샘인지 하는 전화들을 걸어오곤 했다.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 회사 사정이 뉴스를 통해 신속히 보도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직급별로 얼마가 나왔다는 것까지, 나보다 소상히 알고들 있었다.
내 주머니 사정을 남이 다 알고 있다는 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어서 나는 그 때마다 조금 불편했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적극적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나 역시 SNS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계정을 만들고 ‘개념없이’ 내 일상을 까발렸다.
최근에 태평양 건너편에 사는 어떤 분이 나의 블로그를 통해 말을 걸어왔다. 물론 생면부지의 사람이다. 나는 그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지도 않았고 노출된 이름도 실명 대신 닉네임이란 걸 쓰고 있었다. 그이는 그러나 나의 얼굴, 직업 뿐 아니라 가족상황, 몇 군데에 올려 놓은 글들까지 섭렵하고 내게 말을 걸어 온 것이다. 더럭 겁이 났다. 그이는 나의 블로그를 좋아해 준 사람으로 악의가 있었던 게 아니지만, 내 정보가 다 털렸구나 하는 생각만은 어쩔 수가 없었다.
블로그라는 유리상자에 스스로 들어가 갇혀 버렸다는 걸 나는 그 때서야 깨달았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레미 밴담이 1791년 설계하여 만든 팬옵티콘(panopticon)이라는 원형 감옥이 있다.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는 뜻의 ‘opticon’이 합성된 말로 이 감옥은 중앙에 감시탑을 세우고, 감시탑 둘레를 따라 죄수들의 방을 배치하는 구조를 취한다. 중앙의 감시탑은 늘 어둡게 하고, 죄수의 방은 늘 밝게 하여 중앙에서 감시하는 감시자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죄수들이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죄수들은 자신들이 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결국 죄수들은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 해서 스스로를 감시하는 지경에 이른다. 팬옵티콘은 감시자 없이도 죄수들 자신이 스스로를 감시하는 감옥을 말한다.
블로그 뿐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스냅챕까지도, 이것들은 이미 현대판 팬옵티콘으로 성장한 듯하다.
전자카드니 소셜넘버 등으로 개인은 이미 권력기관의 통제 아래에 놓여있은 지 오래다. 골목길 구석구석까지 감시카메라가 매복하고 있다.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개인의 동선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닌 세상에 살고 있다. 화장실에서 조차도 이곳에 카메라가 있나 둘러봐야 하게끔 되었다.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을 고안해서 젊은 나이에 일약 스타 부자가 되었다. 그가 페이스북을 창안하게 된 계기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골탕먹이려는 것이었다는데, SNS의 존재 방식인지도 모르겠다. 누가 더 많이, 널리 ‘소식’을 퍼뜨리느냐가 우리가 SNS에 매달리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SNS에 자신의 ‘Social’을 과시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Networking’의 ‘바다(Sites)’에 알몸으로 뛰어드는 행위가 된다는 걸 우리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SNS는 이미 전 세계적인 사회 현상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을 팔아먹으며 살고, 어떤 사람은 남의 사생활을 주워 담으며 살아간다. 두려운 건, 이 사회가 더 이상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4.1.16)